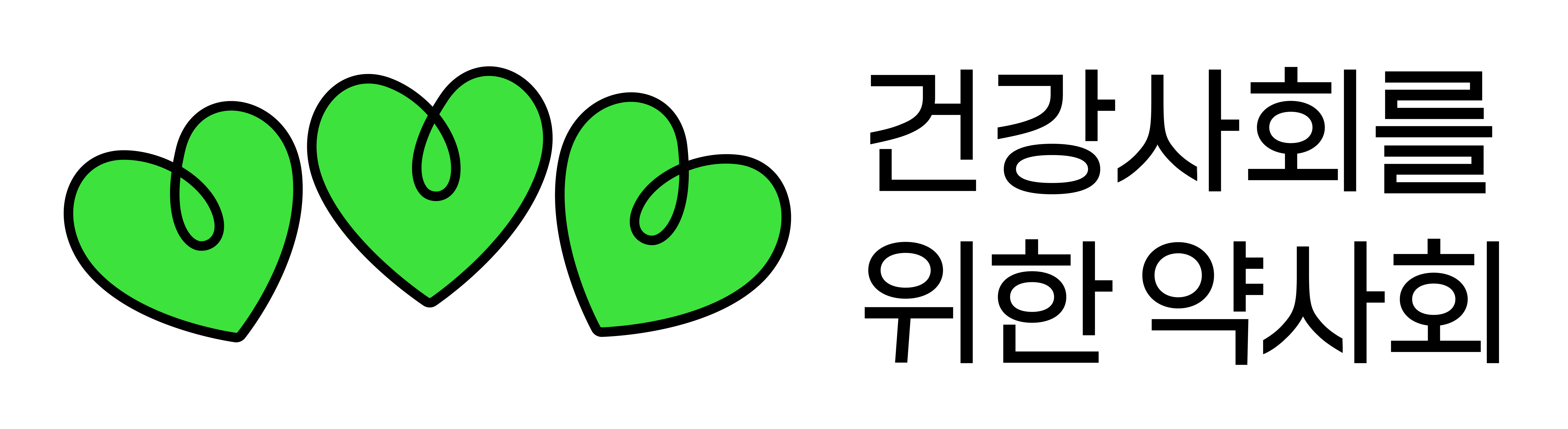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
약값엔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 있다는데…
마르시아 안젤 지음|강병철 옮김|청년의사|316쪽|1만3000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은 일반 상품과는 같을 수 없다고들 생각한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오랜 연구 끝에 신약을 개발한다는 제약회사에 각별한 느낌을 갖는다. 일반 기업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선량한 이미지를, 막연하게나마.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주장하는 신약의 효과는 과장된 것일 뿐, 실은 예전에 쓰던 약보다 못하다면? 그들이 지출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연구 개발이 아닌 대중을 속이는 마케팅에, 공무원과 의사를 매수하는 데 쓰인다면? 생명을 구하는 획기적인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공공기관이나 대학의 연구 성과를 가로챈 것에 불과하다면? 있지도 않은 병을 만들어 그 치료제를 팔아 먹는다면?
저자 마르시아 안젤(Marcia Angell·68)은 이 모든 질문이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관한 진실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그들의 가면을 철저히 벗긴다. 미국 하버드의대 의료사회학 주임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세계 최고의 의학 학술 잡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Ne 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편집인으로 20년간 일해 왔다. 그는 1812년 창간 된 이 학술잡지의 첫 여성 편집장이었으며 종신 수석편집인이기도 하다. 지난 20여 년 간 그는 제약산업이 의학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켜봤고, 2004년에 이 책을 써서 논란을 일으켰다.
제약회사가 실제로 한 일은? 신약의 효과가 훨씬 돋보이도록 기존의 약과 비교하는 대신 위약(僞藥·아무 효과 없는 가짜 약)과 비교하게 했다. 1년간 복용하는 값이 1만 달러에 달하는 약값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고 광고했지만 미국 국립암연구소나 대학에서 연구한 성과를 싼 값에 사들였을 뿐이다.
대부분의 신약은 기존의 약을 약간 변형시킨 ‘나두요 약’(me-too drug)이다. 미국 국회의원 1인당 한 명 이상의 제약업계 로비스트들이 로비를 벌인다.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AZT,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항암제 택솔, 블록버스터 알레르기약인 클라리틴 등의 실례를 보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가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싼 값에 사들여 비싼 값으로, 그것도 독점권을 행사하며 약을 판다.
그러니 국민의 주머니는 두 번 털리는 셈이다. 한번은 공공 연구비 지원에 들어간 세금으로, 또 한번은 약값으로. 약값에는 마케팅 비용과 특허권을 연장하는데 쓰인 변호사 비용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다. 비쌀 수 밖에. 저자는 임상시험 감독 기관을 만들어 임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제약회사들이 쉽게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제약회사들이 제공하는 지원이나 연수 교육을 의사들이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약회사는 상품을 파는 기업임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소비자들 또한 새 약을 처방 받을 때는 철저하게 따져 물으라고 저자는 권한다. 이 약이 더 낫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그 증거는 제약회사가 제공한 것인가요, 선생님은 이 약의 제조사와 금전적 연관은 없으신지요? 정말 이렇게 묻을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지만. 원제는 The Truth About the Drug Companies:How They Deceive Us and What to Do About It.
더 읽을 만한 책
질병 판매학 (레이 모이니헌 지음·알마)은 특히 다국적 제약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파고 든다. 일상에서 흔히 겪는 불편함이 어떻게 심각한 질병으로 명명되고,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준다. 몸 사냥꾼-거대 제약회사의 추악한 얼굴 (소니아 샤 지음·마티)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 제약회사들이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선을 제약회사에서 현대의학으로 옮기면 병원이 병을 만든다 (이반 일리히 지음·미토)가 있다. 가톨릭 사제 출신의 저자가 쓴 이 책에서는 병원을 찾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고, 질병이 인위적으로 ‘창조’되는 등 병의 ‘사회학적 진화’ 과정에 개입된 병원과 의사에 대한 비판이 따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