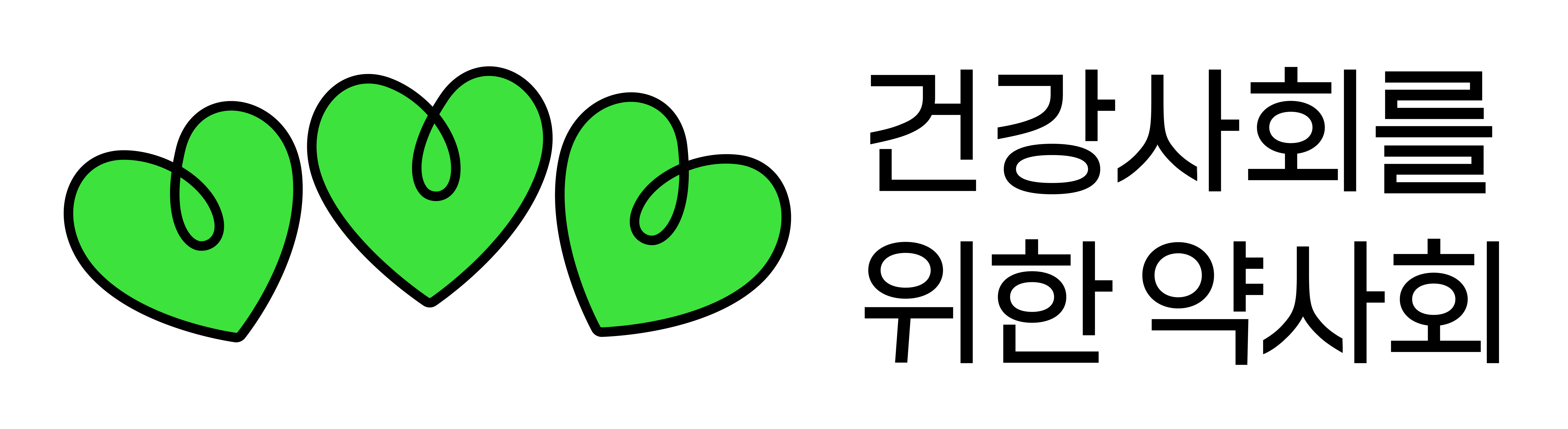[내일신문 2006-03-27 17:18]
미국 제약회사, 임상 위해 무차별 인간실험
지난 13일 영국에서 신약임상실험 도중 6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 직후 같은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에 참가했던 기자가 ‘나는 인간 실험쥐(모르모트)였다’는 기사를 내보내 영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신약실험의 위험성과 함께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윤리논란이 뜨겁다.
신약임상실험 사고가 발생하기 3주전.
영국 지 객원기자는 미국 항생제 전문 제약사 ‘파렉셀’이 유급 실험참가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들었다. 파렉셀사가 실험비용으로 1회 당 1000파운드(약200만원)를 준다는 말에 기자는 영국 노스윅파크 병원에서 진행되는 임상실험에 참가했다.
파렉셀사는 기자의 혈액·소변검사를 하고 몸무게와 혈압 등을 측정했다. 의사는 실험용 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지만 별달리 위험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다.
실험실도 신문과 잡지,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게임기구)과 위성방송, 당구테이블이 마련돼 마치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기자에 따르면 ‘인간 실험쥐’들은 대부분 20~30세로 용돈을 벌려는 대학생이나 여행자였다. 이들 중에는 외국인이 절반가량이었다.
실험에 참가한 한 아르헨티나 남성은 “한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임상실험으로 목돈을 번 후 본국으로 돌아가곤 한다”고 털어놨다.
실험에 참가한 이들은 병원을 나오면서 이제 ‘실험 쥐’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참가자 명단에 오르면 제약회사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3일에 650파운드 제공, 1주에 1000파운드(200만원), 2주에 2000파운드(400만원)’ 등 문자를 끊임없이 보내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진다.
기자 역시 올 봄 두번째 실험에 참가했다.
기자와 함께 실험에 참가한 한 뉴질랜드인 청년은 실험도중 경련을 일으키더니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년은 잠시 후 정신을 차렸지만 의료진은 “환자가 25초간 심장이 멈췄을 뿐 실험 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4일간 실험을 받고 1주일 뒤 간단한 건강검진을 한 후 회사는 ‘실험쥐’들에게 수표를 건넸다.
규정에 의해 임상실험에 참가하려면 앞서 실험과 3개월 간격이 있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두세 차례 실험에 참가할 수 있다.
지난 13일 노스윅파크 병원에서 실시된 실험에서 파렉셀 신약을 복용한 참가자 6명이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중태에 빠졌다.
특히 21살 뉴질랜드 청년 라이언 플래네이건은 머리가 부어 3배나 커지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그의 가족은 “라이언의 머리가 허리보다 굵게 부어 코끼리처럼 됐다”고 분노했다.
파렉셀이 이들에게 투여한 것은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백혈병 치료제인 ‘TGN 141 2’라는 신약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1인당 2000유로가 지급되는 위험한 약이었다.
하지만 파렉셀사 국제치료약리학 담당 헤르만 슐츠 박사는 “동물실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해 동물과 사람이 같냐는 비난을 샀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나는 인간 실험쥐였다”
3월
27
2006
By site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