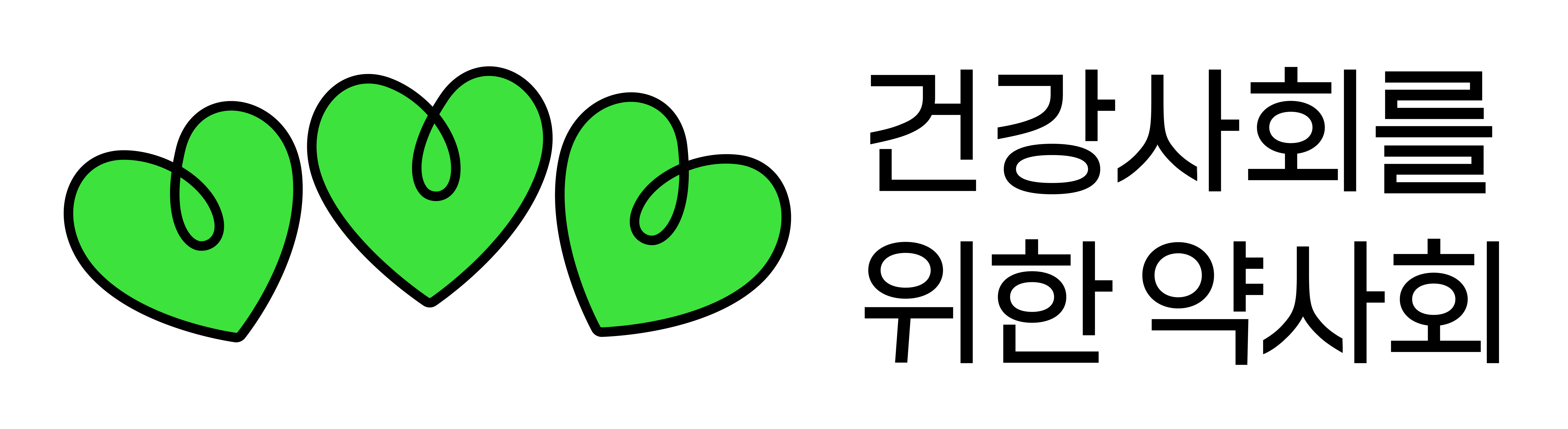제약사 보완연구 소홀로 안전성 담보 미흡
'상당수 제약기업들은 그들이 조기허가 취득의 전제조건으로 FDA에 약속했던 보완연구에 착수하기까지 수 개월에서부터 심하면 몇 년까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하원의원(매사추세츠州)이 1일 공개한 보고서의 한 귀절이다.
조기허가를 취득한 신약을 시장에 발매한 후 짧게는 1년 10개월에서, 심지어는 6년 9개월이 지나도록 당초 약속했던 연구를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례까지 눈에 띄었을 정도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 FDA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어 환자들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마키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마키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FDA가 채택하고 있는 신약허가 신속심사제도(또는 조기허가제도)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론을 제기하고 나선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게 하고 있다.
마키 의원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소속의 다선의원이어서 중량급 정치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약허가 신속심사제도란 효능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6개월 이내에 모든 허가검토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승인 유무에 대한 결론을 도출토록 한 것이다. 해당 제약사측이 보완연구를 전제조건으로 요구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존 치료제를 크게 능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아직껏 뚜렷한 치료제가 부재한 적응증 또는 치명적인 질병을 타깃으로 한 후보신약들이 검토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 제도의 검토대상으로 선택받지 못한 표준심사 대상 후보신약의 경우 FDA가 허가 유무를 검토하는데 빨라야 10개월, 통상적으로는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는 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의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클루드'(엔테카비르)나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폐암 치료제 '이레사'(제피티닙) 등이 바로 신속허가 검토대상 신약이었다.
그러나 마키 의원은 '해당 제약사측이 신속심사 검토대상으로 지정된 후보신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효능·안전성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고도 서둘러 제품제조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해당 제약사측이 보완연구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기허가 결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FDA에 주어져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
의사와 환자측의 입장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신속허가 검토절차를 거쳐 조기에 허가를 취득했는지 알기 어려운 데다 제품라벨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관련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마키 의원은 언급했다.
마키 의원은 '따라서 의사나 환자들이 특정 의약품의 신속허가 검토대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FDA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검색해야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제약협회(PhRMA)는 반론보도문을 내고, 신속허가 검토제도의 효과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특히 PhRMA측은 '지난 20여년 동안 안전성 문제로 회수조치된 의약품이 전체 허가취득 제품수의 3% 이하에 불과하며, 15년 전 신속허가 검토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도 이 수치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FDA의 수잔 크루잔 대변인도 '신속허가 검토제도를 통해 승인된 신약들이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FDA는 어느 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1,339건의 미해결 연구과제 중 61%가 착수조차 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통계치를 공개했던 것은 한 예라는 것.
FDA 신약심사국의 존 젠킨스 박사는 '신속허가 검토제도의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입력 2005.06.02 07:32 PM, 수정 2005.06.02 07:33 PM
신약허가 신속심사제도 폐지론 '불쑥' --약업
6월
06
2005
By site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