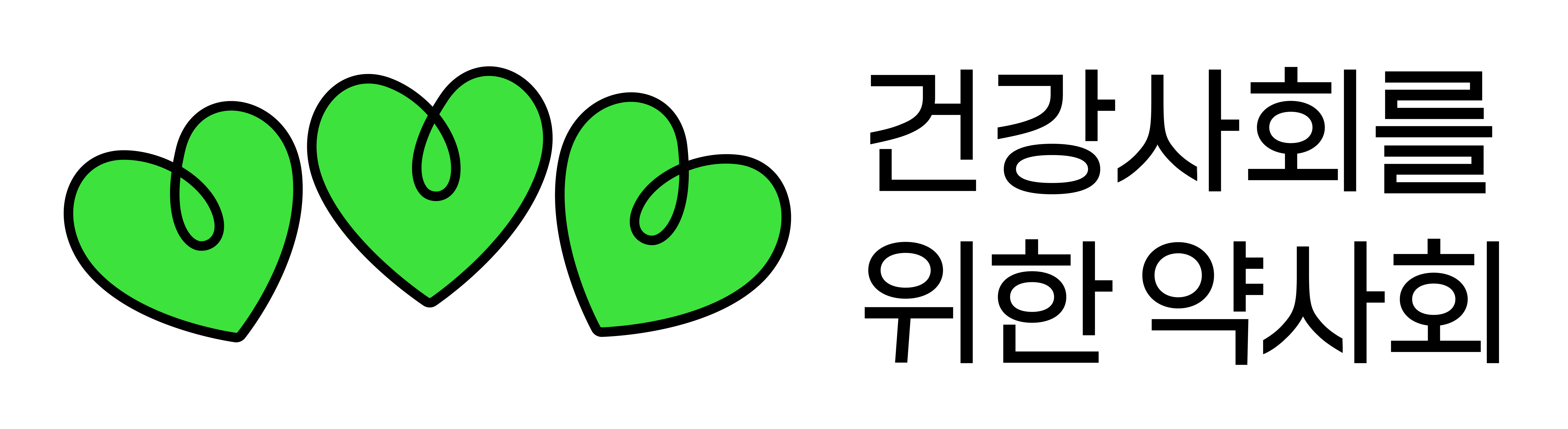[약알고먹자] '먹을 수 없는 약'도 약인가
새로운 약에 대한 특허권, 거의 누구나 한번쯤은 들은 이야기일 것이다. 제약회사가 새 약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게 하고, 개발에 투자된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해 20년 동안 독점권을 주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그 누구도 같은 약을 만들 수 없다.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매겨도 이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가 된다. 만약 그 약물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면 환자들은 약이 있어도 돈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다.
글리벡은 노바티스라는 스위스계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다. 이전에 백혈병의 유일한 치료법은 골수 이식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고 기증자를 찾기도 힘든 단점이 있다. 또다른 치료법인 항암치료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 치료 효과 및 안전성에서 문제점이 많다. 이에 견줘 글리벡은 다른 항암제 치료보다 더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독점 생산자인 노바티스가 강요하는 엄청난 가격이다.
노바티스가 주장하는 높은 약값의 이유는 의약품 개발에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가 든다는 것과 특허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연구 개발 의지가 떨어져 어느 제약회사도 좋은 신약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이 깔려 있다. 하지만 지금껏 그 어떤 제약회사도 그토록 강조하는 의약품 개발비를 제대로 밝힌 일이 없다.
이 연구개발비라는 부분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다양한 세금 감면과 조세 혜택이 있다. 또 정부기관과 공적 자금의 지원도 있다. 아울러 의약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화학·물리·생물학적 연구 성과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새로 개발된 신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노동과 그 성과의 산물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그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며 특허권을 방패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이다.
의약품 접근권은 ‘효과 좋은 약을,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으로 먹을 권리’로 말할 수 있다. 이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환자들의 요구가 특허권이라는 공고한 성에 가로막혀 빈 메아리로만 되돌아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제약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며 특허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생명을 거스르는 ‘정당성’은 과연 정당한가? 가격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약을 과연 약이라 할 수 있는가?
현수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