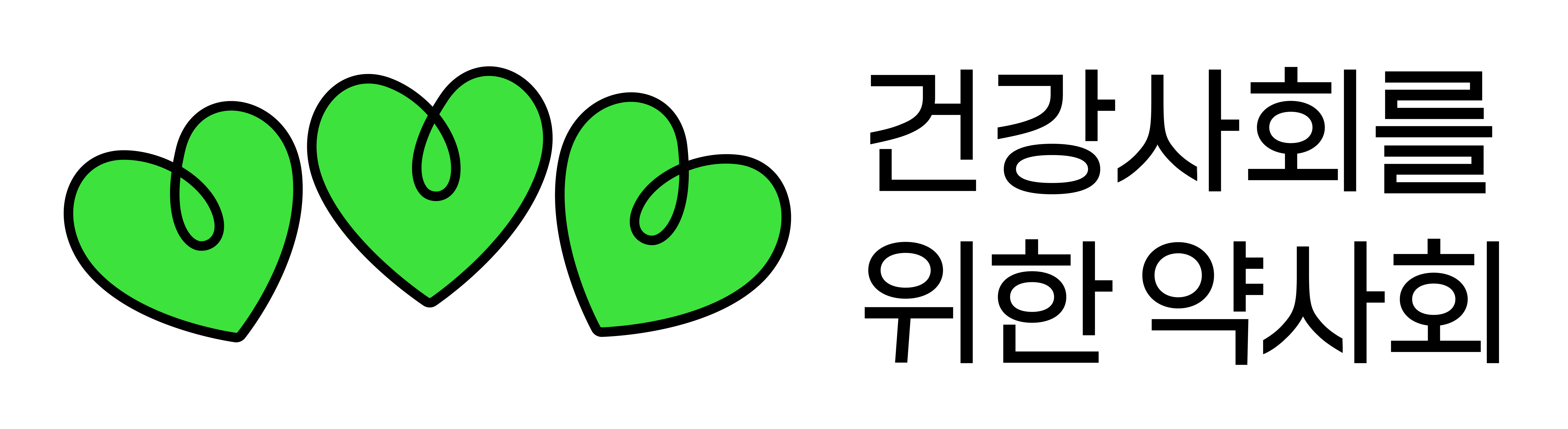[약 알고 먹자] 약 권할 수밖에 없는 사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약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흔히 술 권하는 사회만큼이나 ‘약 권하는 사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다. 그런데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것은 제각각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약에 대해서 유난히 관대하고 선호하는 국민성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의 해법으로 약을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권유도 잊지 않는다. 비전문가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전문가들이 약의 오남용을 막는 교두보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처방을 내릴 때 넣는 약 품목 수가 평균 4.13개에 달해 1.9개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의 경우 5개에 육박해 선진국에 견줘 3배 정도의 처방 약품 수를 나타낸다.
이런 통계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단순히 개인 탓으로 돌리고 이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상업적인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약사도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사회현상의 책임을 개인과 특정 집단에 돌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흔한 수단이다. ‘약도 약이지만 휴식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약국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백이면 백 모두 다 ‘쉴 수 있나요?’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약 권하는 사회가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장시간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 해 노동 시간은 2316시간으로 회원국 평균 1786시간보다 530시간이나 더 길다. 또 2000시간 이상 일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처지에서는 당장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우린 ‘약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을 권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듯이, 약의 오남용도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약 대신 휴식을 권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보건의료 전문가, 노동계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윤영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