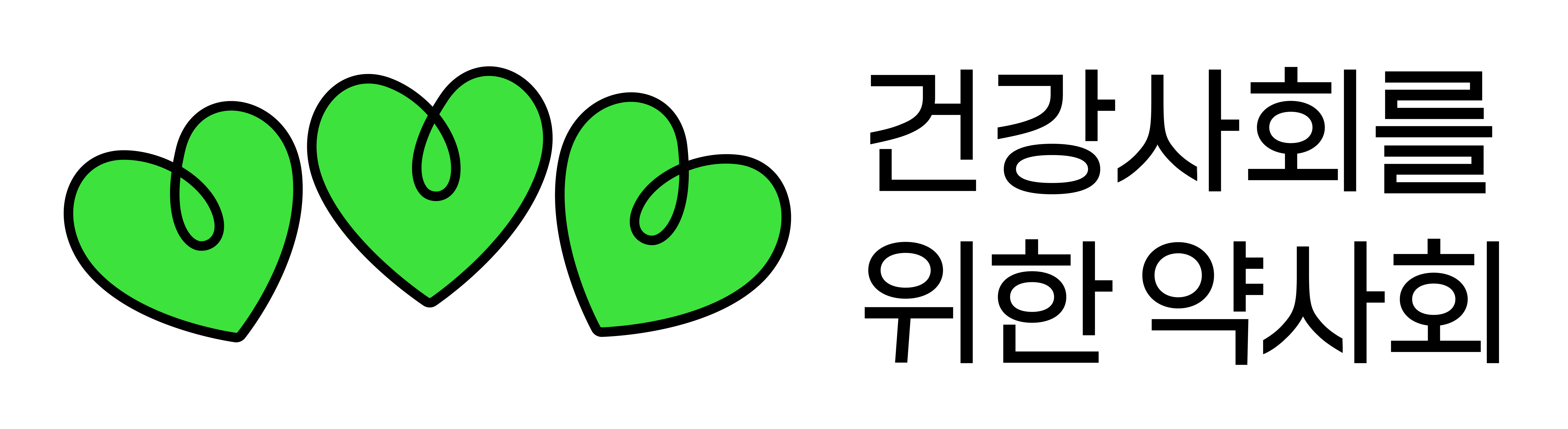[한겨레 연재/ 약알고먹자] 영국선 금지된 약이 한국선 괜찮다?
미국 유타주에 살고 있는 그룬버그는 자신의 어머니 생일 하루 전날인 1988년 6월19일, 생일 축하 카드 대신 어머니의 머리에 8발의 총격을 가했다. 하지만 법원은 1년 뒤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물 부작용 때문에 생긴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이란 이유였다. 그가 먹고 있었던 약은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으로 널리 처방되고 있던 ‘할시온’이라는 약물이었다.
이후 1991년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할시온이 피해망상, 기억 손상, 환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효능군 의약품 가운데 생산액 4위를 유지하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 다국적 제약사는 2004년 ‘뉴론틴’이라는 약물 때문에 미국에서 4억300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뉴론틴은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간질 보조치료제’ 등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불법 판촉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처벌받은 바로 그 효능을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팔고 있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약이라도 모든 국가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효능이나 금기사항, 부작용 정보 등이 국가마다 다른 것은 셀 수 없을 정도이고, 심지어 일부 나라에서는 퇴출된 약이 다른 나라에서는 버젓이 팔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약회사에는 약의 효과와 안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각 나라의 보건당국은 대개 그 자료를 기초로 약에 대한 허가를 내준다. 그런데 제약회사가 자사 제품에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숨겨버리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비틀어진다. 예를 들어 쉐링이라는 제약회사는 ‘다이안느’라는 약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면서 ‘피부에 좋은 피임약’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간에 끼칠 수 있는 독성 때문에 절대로 피임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호르몬과 관련된 심각한 여드름에 짧은 기간만 사용’하도록 수차례 경고를 발동했다. 약에 대한 정보 가운데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디에선가는 폐기된다. 쓰레기통에 어떤 정보를 버릴 것인가는 제약회사의 선택이고, 이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환자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강아라/약사ㆍ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