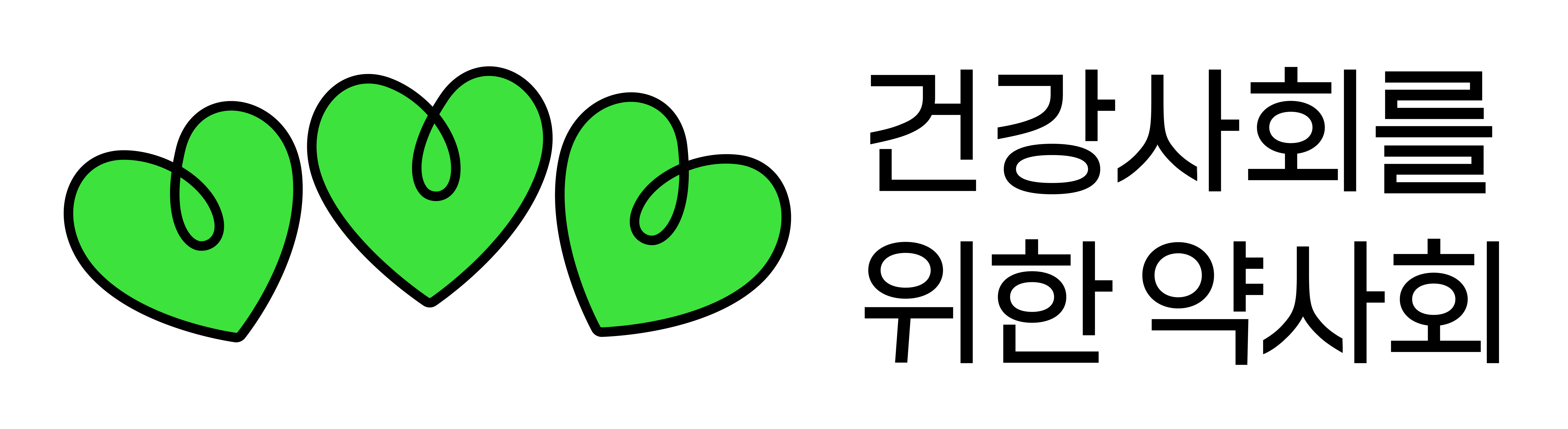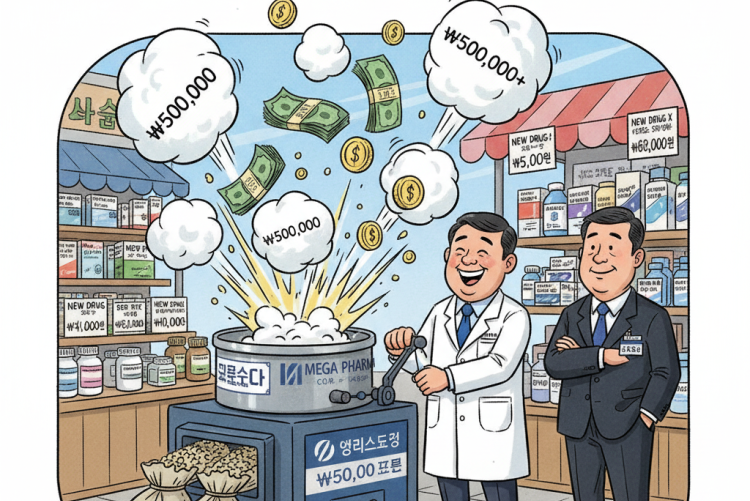- 28일 건정심, 원칙 없는 이중약가 확대 안건 즉각 폐기해야
- 환자의 접근권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의 투명화 흐름에 동참해야
정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중약가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환자의 접근권 향상이 아닌, 오로지 제약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접근권 확대와 무관한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
정부, 중증질환이 아니며 대체약제와 효과 비슷한 약까지 이중약가제 확대에 나서
현재 신약의 약가 결정 방식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기존약과 효과가 유사하여 투약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방식(전체 신약 중 약 60~70%), 둘째,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로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해외 약가를 참조하는 방식(10~20%), 셋째,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경제성 평가를 거치는 방식(10~20%)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위험분담제’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약가결정 방식에서 이중약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이며 환자에게 필수적인 약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겉으로는 높은 가격(표시가)으로 계약하되, 실제로는 제약사가 차액을 환급하여 실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불투명성은 ‘환자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용인되어 왔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제 기존약과 효과가 비슷한, 즉 대체 가능한 약제에까지 이 가격 은폐막을 씌워주겠다고 한다. 이미 참조가격제와 경제성 평가 대상 약제 대부분이 이중약가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투명하게 운영되던 ‘투약비용 비교’ 약제 마저 철저한 비밀주의 속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는 하등 상관없는, 철저한 국내 제약기업을 위한 ‘산업적 특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수출 핑계로 제약사 ‘배불리기’에 ‘눈가리기’까지 나서
정부는 국내 신약의 수출을 돕기 위해 이번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약가가 높게 표시되어야 해외 수출 시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2023년 국내 제약산업 생산액 30.6조원 중 수출액은 9.9조원(전체의 32%)에 불과하다. 수출산업이라기보다는 내수산업에 가깝다. 수출규모도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1% 남짓이다. 수출액의 상당 부분은 바이오시밀러나 위탁생산(CMO)이 주를 이루며,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규모는 매우 초라하다. 국내 신약 중 매출 1위인 케이캡정(2018년 허가)의 2024년 수출액은 고작 81.5억 원, 대웅제약 펙스클루 정(2021년 허가)은 47.5억 원에 그쳤다. 기술수출을 한 롤론티스나 렉라자 역시 판매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벌어들이는 수준이다.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는 기껏해야 수십억 원, 많아야 수백억 원 규모의 신약 수출을 지켜주겠다고 국가의 약가제도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값을 가산하는 등 환자의 주머니와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제약사의 장부를 메워주는 방식을 넘어,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의 원칙인 투명성마저 팔아버리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투명성’으로 가는데 한국만 ‘밀실’로 퇴행
전 세계는 지금 치솟는 약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는 의약품 가격, R&D비용, 공공자금 기여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많은 나라들은 약값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연대하여 약값 인상에 대응하고 있다. 약가 거품을 빼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은 국제적 합의이자 흐름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반대의 길을 가려 한다. 정부의 ‘약가 뻥튀기 정책’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려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각 국가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있음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는 몇몇 국가의 자국 이기주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의 투명화 요구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의 ‘약가 가리기’ 전략은 다른 나라에 비싼 값에 약을 팔기 위해 자국민에게 보여주는 가격표를 조작하겠다는 발상이며, 국격마저 떨어뜨리는 졸속행정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수출을 핑계로 제약산업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소위 ‘국내 유연약가제도’는 약가 뻥튀기 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산업논리에 매몰되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을 약가제도 퇴행을 멈춰야 한다. 국제사회의 제약산업 투명화 흐름에 동참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건보재정의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