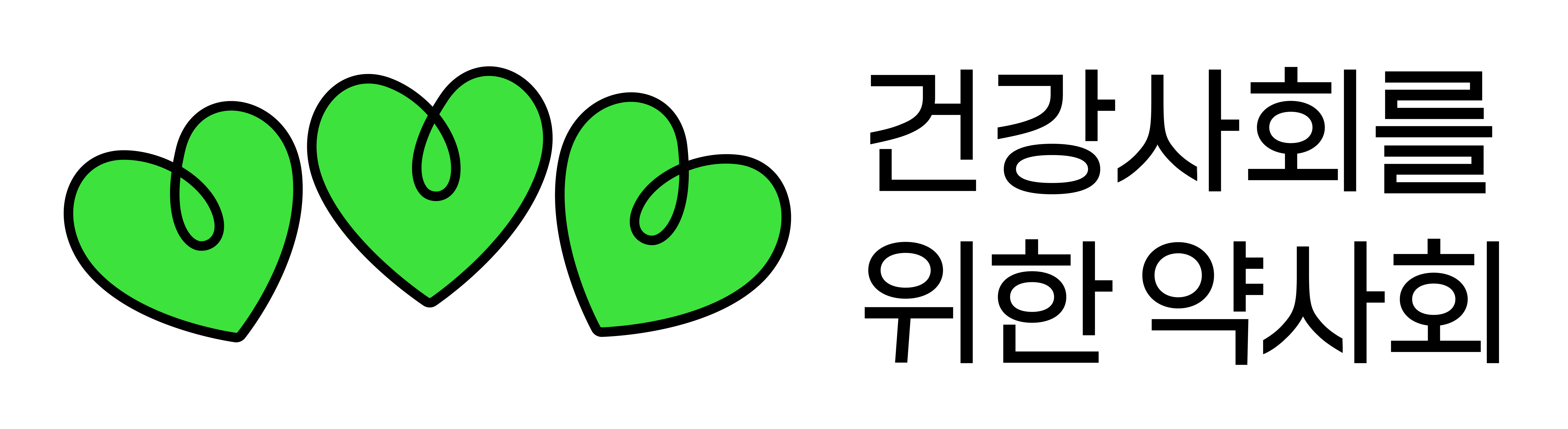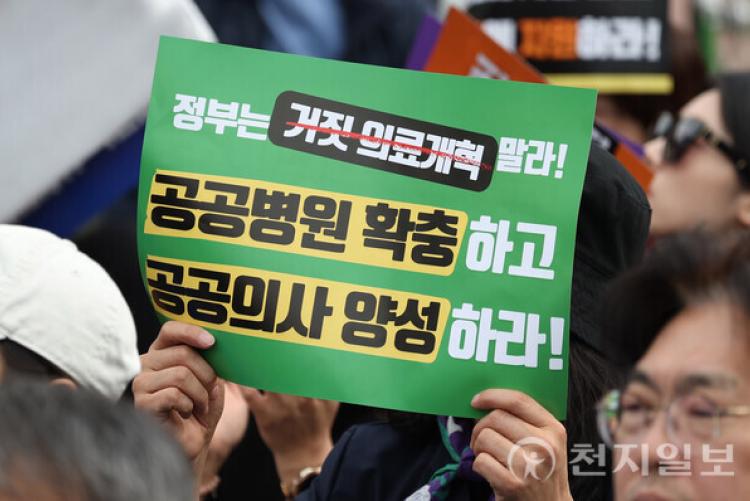-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