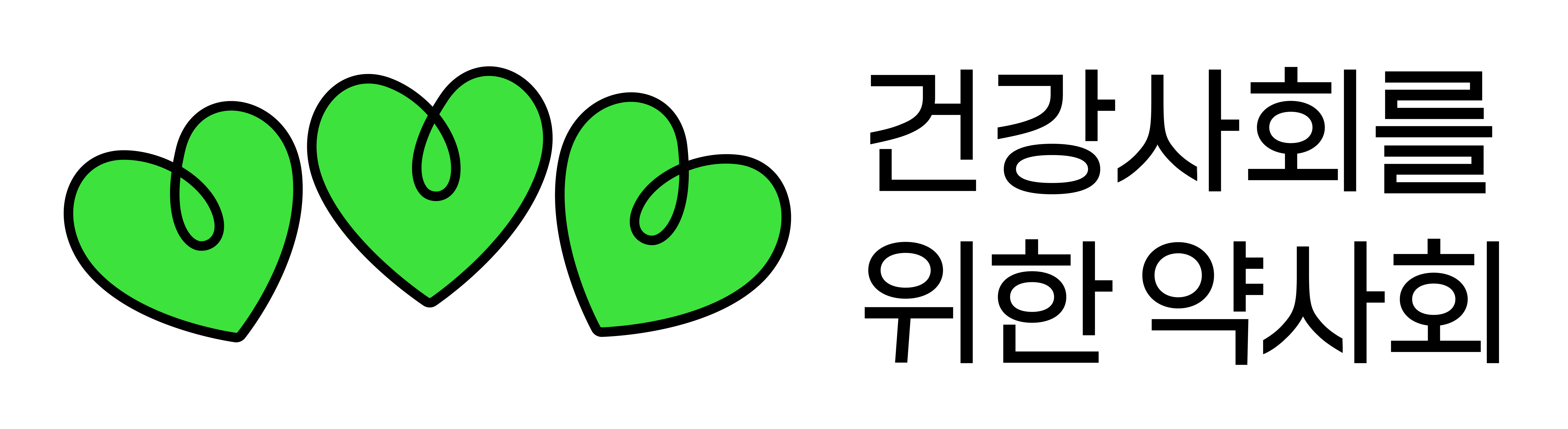2월
03
2009
By site manager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 특허청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특허청 발명정책과 팩스: 042-472-3464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71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제안:바로가기
● 의약품접근권과 건강권에 대해 그리고 제약회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단체나 모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이메일 :naengee@hotmail.com
전화: 016-299-6408(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홈페이지: http://medicineact.jinbo.net/webbs/view.php?board=medicineact_7
다들 한번쯤은 처방전을 받아 약을 타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에 3000원을 내셨다면 약제비전체는 1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값의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70%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이 됩니다. 감기약 2~3일분에 3000원이 누구에게는 ‘그 정도쯤이야’일 수도 있고, ‘헉’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직접 다가오는 부담, 즉 본인부담금뿐만아니라 약제비전체를 보면 우리의 심적, 물적 부담은 몇배가 됩니다. 1만원이라는 약제비는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건강보험재정)와 주머니(본인부담금)에서 나갑니다.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이 된 약제비는 2001년에 4.2조, 2006년에 8.4조로 5년간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제비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정부에서도 약제비를 절감하기위해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돈을 쏟아 붓는다고 보장성이 확대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재정이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에서 정부도 약제비를 통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약값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죽든지 신(神)의 뜻대로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약제비적정화방안은 제약회사에게 ‘적정한’ 방안이었습니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후 첫 사례인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은 연간 4,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초국적제약회사 BMS(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는 스프라이셀 약값으로 연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20%의 가격인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제비적정화방안은 환자생명을 놓고 4,000만원이냐, 5,000만원이냐 판돈을 거는 노름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약값을 정하는지’ 묻자 돌아온 답은 ‘약값은 오직 신(神)만이 알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神)은 제약회사였습니다. 스프라이셀 약값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제약사가 공급거부를 하지 않을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스프라이셀과 똑같은 약을 만드는데 드는 최대 비용을 고려해보면 스프라이셀 1년치 약값 4000만원중 3800만원이상이 BMS의 순이익이 되는 셈입니다. 얼마나 이익을 볼 것인지, 누가 그 약을 먹을 수 있을지를 이 신(神)이 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선택당하는 우리의 생명은 신(神)의 손바닥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神)의 뜻을 거역하였을 경우에는 ‘푸제온’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은 2004년 11월에 약 25000원(연간 1,800만원)으로 보험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슈는 약 3만원(연간 2,200만원)을 요구하며 4년이 넘도록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HIV감염인들이 푸제온의 약값인하와 공급을 요구하자 로슈는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로슈는 구매력이 없는 환자는 푸제온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며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이 없다며 차라리 환자단체에서 약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800만원이든 2200만원이든 감당할 수 없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약값을 올려줄 것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푸제온과 똑같은 약을 공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한민국은 특허권을 존중하는 stance를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약값을 올리라는 신(神)의 뜻을 거역하였고, 그 대가로 생명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했던 살인
우리는 제약회사와 한국정부가 한 일을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 수 있는데 죽음으로 몰아갔으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아닌 저들이 결정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2001년에 백혈병환자들의 절규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푸제온, 스프라이셀 문제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글리벡을 기억하십니까? 초국적제약회사의 독점은 의료보장성마저 위협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01년 ‘기적의 약’이라 불리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비싼 약값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부터 입니다. 노바티스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글리벡을 25000원(월 300~75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환자들은 '약값인하'와 '보험적용확대',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허여'를 요구하며 1년 반이 넘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바티스의 요구대로 23045원으로 결정하고, 강제실시를 불허하였습니다. 당시 '낫코(Natco)'라는 인도의 제약회사는 한국의 환자들에게 글리벡과 똑같은 약 '비낫(Veenat)'을 1달러, 즉 글리벡의 1/2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했었는데도 한국정부는 노바티스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후에 한국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비싼 약값 때문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이란 걸 만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는 한미FTA협상에서 특허권을 있는 대로 강화해주었고, 의약품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지요. 푸제온, 스프라이셀의 경우를 보더라도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약제비를 통제하거나 한미FTA의 폐해를 완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생명권박탈이라는 형태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건강할 ‘자격’이 있다? No!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푸제온 약값 5000원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나 치료받고 건강할 권리를 ‘자격’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글리벡, 푸제온, 스프라이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항하고자 하는 것은 5000원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을 두고 돈지랄’을 하는 그 자체입니다.
신(神)의 뜻을 거역하여 생명권을 박탈당한 우리는 살아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12월 23일에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푸제온과 똑같은 약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취해온 입장을 보았을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건강권을 책임져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있다고 알고 있지요. 그러나 신(神)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만이 건강할 ‘자격’을 가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잖아요.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09.02.02
푸제온.스프라이셀 공동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