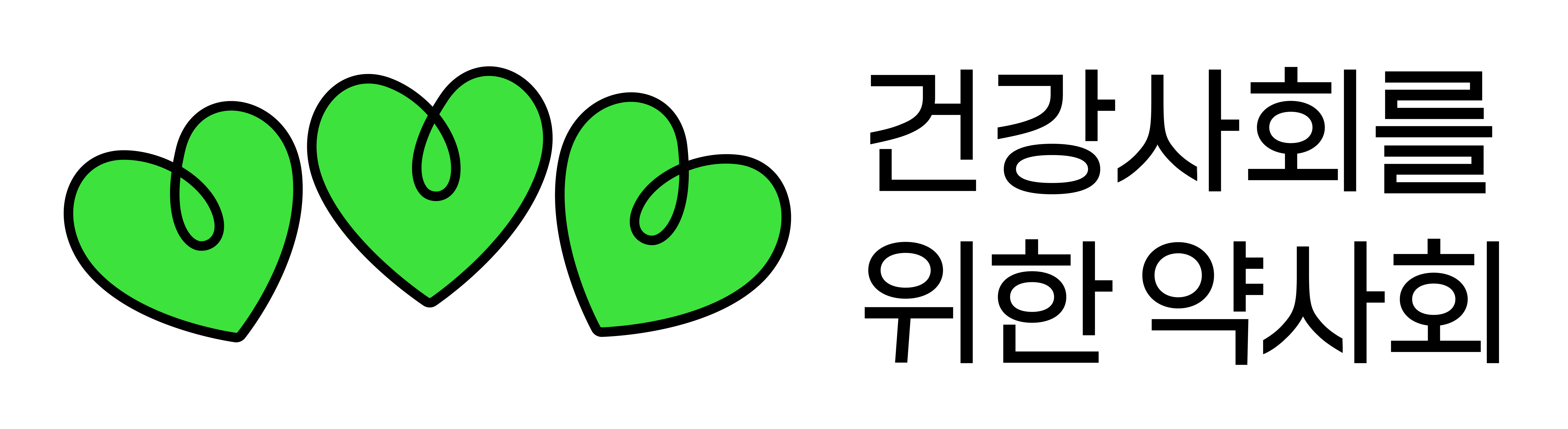백용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조직사무국장)
작년 가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유명한 폴란드 크라쿠프를 방문했다. 크라쿠프에는 아우슈비츠 말고도 “쉰들러 리스트”로 유명한 오스카 쉰들러의 공장도 유명한 관광지이다. 쉰들러의 공장을 나와서 인근에 나치 시절 핍박받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팸플릿을 보고 있었다.
독수리 약국(Apteka Pod Orlem)과 타데우즈 판케위츠(Tadeusz Pankiewicz)
신촌 어드메쯤 위치한 약국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1940년대 크라쿠프에 침공한 나치는 시내 한켠을 지정해 ‘게토’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강제 수용지역을 만든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잘 안된다면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가 멀쩡한 땅에 콘크리트 벽을 세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통제하고 고사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 나치는 게토로 지정된 구역에 있던 비유대계 폴란드인들을 구역 밖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상하게 독수리 약국만 자리를 비우지 않고 꿋꿋이 남아있었다.
게토 내에 있던 약국을 운영하던 비유대인 판케위츠 약사는 게토를 비우고 크라쿠프 시내 중심가의 유대인 약국을 인수하라는 나치 군부의 제안을 거절한다. 대신 그는 고립된 게토 안에서 독수리 약국을 계속 운영한다. 고립된 게토 안에서 독수리 약국은 24시간 의약품 서비스는 물론이고 게토 내 유대인 지식인들의 접선장소가 되기도 하고 강제수용 과정에서 다친 이들에게 무료로 의약품과 음식을 공급하기도 한다. 하루하루 목을 졸라 오는 나치의 탄압에 신음하던 게토 안의 유대인들에게 독수리 약국과 판케위츠는 말 그대로 ‘없어선 안 될 존재’였다.
화상 투약기의 등장
2007년 경기도 약사회에서 약국에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과 건강에 관한 정보전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약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 본다. 모든 약국을 불문하고 환자들은 ‘타**놀’, ‘판*린’, ‘게*린’과 같은 유명 진통제, 감기약을 많이 찾는다.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높은 제제는 왠만하면 1알씩 먹는게 좋겠다고 복약지도를 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2알씩 먹는 약 아니냐고 질문을 하고 나는 다시 해당 제제들의 간 부작용과 미국 제조사에서는 자체적으로 1일 3000mg 까지 먹을 것을 권고했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급성 간부전으로 응급실 찾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주곤 한다. 더러 흘려듣는 환자들도 있지만 환자들은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놀라워한다. 고맙다고 인사하는 환자들을 보면 마치 내가 큰 도움이라고 준 것 마냥 우쭐거릴 때가 있다. 이런 경험은 한 번씩 해보셨을 듯하다.
최근 화상투약기를 개발한 약사가 보건의료 전문지에 자신의 입장을 알려왔다. 핵심을 요약하면 화상으로 대화하는 것이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일반인에 의해 판매되는 안전상비약보다 더 나은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개발자의 관점에서야 충분히 설득 가능한 논리였겠지만 당장 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분야를 보아도 아직 대면 판매가 의무화된 것들이 많다. 당장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싸인을 받는다. 술, 담배조차 자판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의약품을 원격으로 판매한다니, 오히려 환자들이 그래요 되요? 하고 물어볼 것 같다.
환자들은 변비약 하나를 사러 와도 관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구제제를 먹어야 하는지, 배가 아픈 부작용이 덜한 약은 없는지,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궁금한 것이 많다. 당연히 화상투약기에 얼굴만 빼꼼히 내민채 증상만 따박따박 묻는 약사보다 약국에서 직접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약사를 원한다. 지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쟁에서도 드러났지만 환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심야 보건의료서비스이다. 여러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던 심야 공공약국 사업이나 어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서비스의 호응이 대단한 것만 봐도 심야 보건의료 공백지대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보인다.
“얼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쉬운 정답을 두고 왜 나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본 판케위츠 이야기까지 꺼내야 했을까? 우리가 일하는 약국 현장을 돌아보자. 흔히 말하는 “마진 없는” 의약품을 찾는 환자들을 보자마자 “얼마입니다”하고 약만 냉큼 내주는 우리들의 행동과 화상투약기와 다른게 뭔가? 실망스럽게도 많은 약사들이 약국을 의약품을 매개로 환자와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전쟁과 나치의 탄압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판케위츠가 독수리 약국에서 했던 일과 지금의 약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똑같은 ‘의약품 판매’이지만 그 속 내용을 누가 감히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이웃 약국과 경쟁해야 하는 지금의 약사들에게 판케위츠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위인전’ 같은 소리는 그만하라는 핀잔만 들을 것이 뻔하다. 물론 모든 약사들이 판케위츠처럼 헌신적이긴 힘들다. 다만 약사 가운에 걸맞는 권리만큼 그 책임도 일정 부분 져야 옳다. 시장과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깊숙이 빠진 약사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릴 리 없다. 답은 하나.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약사들 스스로가 일반의약품을 우습게 보는 지금의 행태가 지금의 위기를 가져온 책임이 있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더 강화하고 미시행할 경우 벌금을 매기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약사들이 지금껏 해온 행동으로는 화상투약기와 온라인 의약품 판매, 안전 상비약 확대 등 각종 의약품 규제완화를 공짜로 막을 수 없다.
우리동네 판케위츠
앞서 보건의료 전문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화상투약기 개발자는 반대자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했다. 약국과 약사의 미래라는 큰 그림에 여러 변화들이 필요한건 사실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져 가고 있다.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도 원하고 경제성도 원하고 안전성도 원하며 동시에 약사의 전문성과 신뢰성도 원한다. 그러나 화상투약기의 허용은 편의성이라고 하는 한가지 부분만 부각시키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들을 많이 훼손시킬 것이다. IT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몇몇 기기에 좌우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이번 화상투약기 논란이 공공심야약국, 세이프 약국과 같은 상담 전문프로그램의 도입, 차등 수가제도 확대, 부작용 보고와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강화 등 약국을 다채롭게 만들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게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였던 판케위츠처럼 우리도 동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약사가 되는 날을 꿈꿔보자.